기사상세페이지

| <구랍 17일 종로에 있는 흥사단 본부에서 "백두산 문학상" 시상식이 있었는데 2010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김수정 시인이 "고난의 겨울"이라는 시로 신인상을 받았다. 지금 목포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 자유 전도사 겸 사회통일전문교수로 활동하면서 고향에 갈 꿈을 키우고 있다. 통일! 통일을 이루면 그도 새 이산가족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. 고난의 겨울 시인 김수정 바람만 살아 있었다. 동짓달 어느 날 내린 눈은 아직도 여기 저기 휘어 날리고 빽빽이 들어선 비사께 사택도 연기조차 힘없는 농가들도 그 속의 사람들도 소리 높은 눈바람에 휘청이던 고난의 겨울 가난은 핵무기도 저리가라 조롱하며 인간을 위협했다. 사람의 목숨은 낫 가락에 베어지는 소꼴과 같았다. 산자와 죽은 자의 표정도 같았다. 숨이 있는 사람은 걸을 수 있을 뿐이고 숨이 없는 사람은 헌 담요에 쌓여 야산으로 삐걱삐걱 굴러가는 달구지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. 웃음도 온기도 미래도 눈물까지 말라 버린 아사의 도살장 혼이 빠진 사람들 속에서 엄마 그들은 본능 그 자체였다. 온 몸이 연료였고 그 연료를 태워 가족의 목숨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다. 산도 들도 여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. 물독도 강냉이 몇 줌에 팔려갔고 가족들 사흘 연명에 가마도 뿌리 채 뽑혔다. 기다리는 봄 풀이 돋는 봄 봄은 사람들의 희망이었다. 그 겨울 누더기 같은 이불 하나에 엄마는 진해가는 기력을 모아 여섯 살 아들을 품에 안았다. 그녀에겐 아들이 아침을 맞는 것이 어제의 일이었고 오늘의 의무이고 내일의 희망이었다. 병석에 덧 누운 가난이 며칠 전 애 아범을 저승으로 데려 갔다. 그녀의 눈은 화등잔처럼 커가고 광대뼈는 날마다 앞으로 나오고 말라가는 삼십대 혼자라면 다시 맞고 싶지 않은 아침 그리고 이제 숨소리마저 가늘어 가는 아들 탈곡장 한 구석 눈 덮인 북데기 반나절을 뒤적여 쭉정이 한 옹큼 연기가 맴도는 단칸방 절구 속에 한숨 쉬는 쭉정이 한 옹큼 그 옆 기침도 소리 없던 여섯 살 설날 이었다. 설날. 그 날이 설이었다. 그 후 어느 저녁이 그들 모자를 덮쳐 버렸다. 경직된 그녀의 품안에서 노래지는 아침을 바라보며 여섯 살이 눈을 뜬 채 원망의 눈길만 날렸다. 설도 사랑도 헌신도 생명도 고난의 행군 길에 묻힌 그 혼들이 말한다. 인간이었다. 인간이고 싶었다.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자. 참으로 1990년대 후반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을 잘 그린 시다. 이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삶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. 북한정권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보다 북한 주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하며 이에 국제사회도 동참하게 해야 한다. 2016년 새해에는 북한정권이 주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변화시켜야 한다. |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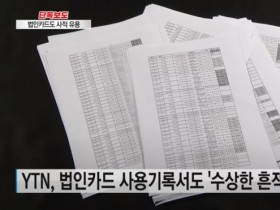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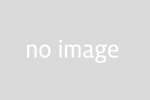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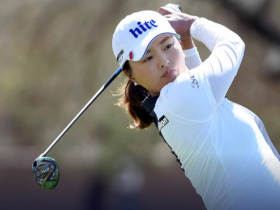


게시물 댓글 0개